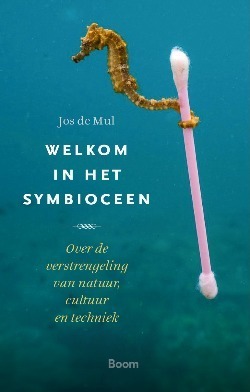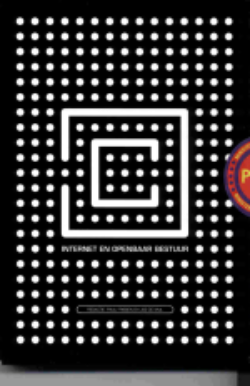Jos de Mul. (in Korean. English title: Digital Dasein. Towards an ontology of virtual worlds). Art Magazine Wolgan Misool (Seoul) 2002 (February issue):110-113.
Digital Dasein. Towards an ontology of virtual worlds (Korean language)
Typography
- Smaller Small Medium Big Bigger
- Default Helvetica Segoe Georgia Times
- Reading Mode



 Vanaf de derde druk verschijnt
Vanaf de derde druk verschijnt